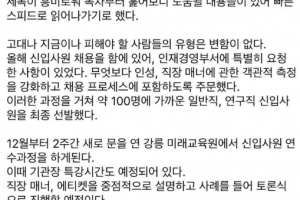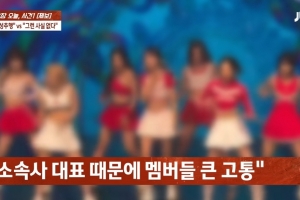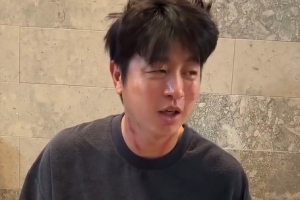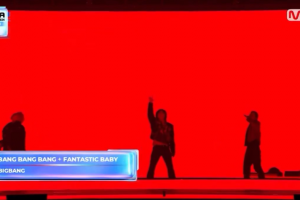‘컴플라이언스’는 보기가 괴로운 영화다. 사기 전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재빠르게 대처하게 된 한국인은 영화를 보다 분통이 터질지도 모른다. 외국의 평을 읽어보면 미국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보던 도중 관객들이 극장 밖으로 빠져 나갔던 모양이다. 당연한 일이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주문을 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최면이라도 당한 듯이 행동한다. 설령 전화를 건 자가 수상하다고 의심했던 인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다. 우선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쁘고 굳이 경찰에게 따지다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해보자. 그들은 왜 얼토당토않은 전화 한 통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걸까. 혹자는 시골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순진함을 언급할 법하다. 그건 아니다. 순진하다고 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컴플라이언스’의 도입부에 삽입된 짧은 장면에서 범인은 간단하게 상대방을 제압한다. 방법이라고 해봐야 단순한 명령밖에 없다. 그는 공중전화에 대고 “존칭을 붙여”라고 거칠게 외친다. 권력을 동반한 폭력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한다. 아마도 수화기 너머의 사람은 급작스러운 무형의 폭력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베키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상할 정도로 순종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해고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다. 보통의 영화라면 더러운 일을 당한 인물은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 따위는 즉각 때려치우고 떠나버린다. 현실은 다르다. 매니저는 지사장의 눈치를 보고, 종업원들은 매니저의 평가에 민감하다. 지옥이 따로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울분을 삭이는 베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서글퍼진다.
폭력은 얼굴을 숨긴 채 뱀처럼 매끄럽게 작동한다. ‘컴플라이언스’는 폭력 앞에서 무력해진 인간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묘사한 작품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 매인 인물들,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하는 손님들, 폭력적인 상황의 중심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물들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찰한다. 그것은 정녕 우리와 격이 다른 타인의 모습일까? 영화는 사건의 해결보다 전개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씁쓸한 후일담을 다룬 짧은 종결부는 긴 여운을 남긴다. 상업영화가 쉽게 가는 길을 포기한 냉정한 자세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90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