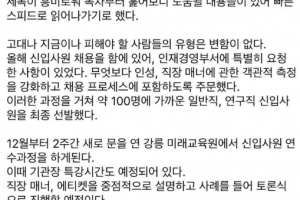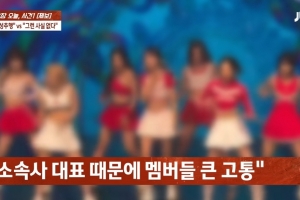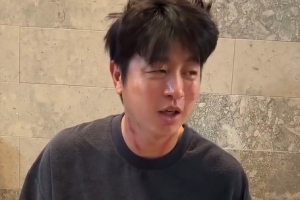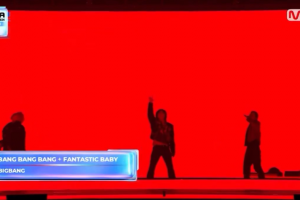한 번 젓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있는 자장면처럼 ‘더 테러 라이브’는 관객들 사이에서 ‘숨 돌릴 틈이 없다’는 호평을 들으며 흥행하고 있다. 개봉 4일 만에 벌써 100만 관객을 넘었다.
순제작비 35억 원에 불과한 이 영화는 4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대작 ‘설국열차’와의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
패기 넘치는 첫 작품으로 충무로에 화려하게 입성한 김병우 감독을 최근 서교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데뷔작을 준비하면서 세운 목표가 “무조건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자”였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 영화로 보일 때보다 사실처럼 보일 때 긴박감이 더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리얼리티에 초점을 두고 한 장소, 한 인물만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을 구상하게 됐어요. 거기서 오는 재미로만 가득 채우자고 생각했죠.”
그러던 차에 ‘테러’와 ‘뉴스’라는 소재가 눈에 들어왔다.
”테러와 뉴스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테러라는 사회 현상은 미디어가 없으면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구조예요. 미국의 9·11 테러만 봐도 이게 뉴스로 보도가 안 됐다면 테러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공격적인 행위 자체가 사회에 확산돼서 대중에게 공포감을 전달할 때 테러가 성립되죠. 월드트레이드센터를 때린 비행기가 두 대였는데, 첫 번째 이후 두 번째가 충돌하는 사이에 시간 차가 몇 초간 있었어요. 그 사이 테러가 저지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테러범이 시간차를 둬서 충돌시킨 것은 뉴스와 카메라들이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당시 뉴스 영상을 보면 마치 영화에서 짜고 찍은 앵글처럼 완벽하거든요. 테러를 기획한 사람은 그것을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내보내려고 일부러 시차를 뒀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한 시나리오가 뉴스 앵커(극중 이름 ‘윤영화’)가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생중계하는 이야기다. 감독은 테러 관련 서적을 읽으며 4년여간 시나리오를 썼다.
파주 세트에서 진행된 실제 촬영은 6주 동안 19회차에 불과했다. 상업영화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짧은 기간이다. 그만큼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는 얘기다. 감독이 보여준 대본에는 배우 하정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의 감정 그래프를 비롯해 매 장면 깨알 같은 메모가 꼼꼼히 적혀 있었다.
”총 5대의 카메라로 찍었는데, 영화에서 방송 스튜디오에 설치된 카메라 2대도 실제로 하정우 씨를 찍고 있었어요. 촬영기사 3명이 한 대씩 찍고요. ‘윤영화’만 다이내믹하게 찍고 싶다고 하면 다 빼고 한 대만 근접해서 찍는다든지 하면서 자유롭게 찍기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테러 장면을 모두 극 중 TV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그래픽(CG)이 정교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준다. 현실성도 높이고 비용도 아끼는 영리한 연출이다.
”예산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런 간접 화면이 현실성을 더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9·11 테러 때에도 당시 HD 카메라가 보급이 안 돼서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는 그 장면은 어떤 영화의 스펙터클보다 더 충격이 컸어요. 거기에 뉴스 헤드라인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화의 테러 장면도 뉴스 모니터 안에 넣어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죠.”
영화는 테러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꼬집는다. 하지만 테러범의 설정이 정교하지 않아 결말에서 힘이 빠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것도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요, 테러범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게 부차적이고 영화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찍어놓고도 삭제한 부분이 많아요. 한 방향으로 직발하는 힘을 유지하고 싶은데 개연성을 위해 설명을 갖다 붙이면 힘과 속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 속도를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 속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찍을 때보다 오히려 편집을 하면서 그런 걸 강하게 느꼈죠.”
감독은 이 영화를 지나치게 현실과 연결해 사회적인 영화로 해석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어떤 관객은 저에게 ‘테러범을 옹호하는 거냐’는 질문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히 사회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테러범이 단순한 악당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름의 사연을 넣어준 겁니다. 이후 상황은 왜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물론 저 역시도 제가 사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정 정권을 비판하거나 거대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뜻밖의 결말에 관해서는 “테러범의 마지막 일격으로 처음부터 정해놓고 쓴 것”이라며 “상업영화라고 해서 무난하게 바꿀 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첫 작품부터 흥행 타를 친 소감이 어떨까.
”성취감이 있다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당분간은 이 영화를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좋은 반응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포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도전하는 기분으로, 탐험하는 기분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신 것 같아서 놀라워요.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한 것 같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