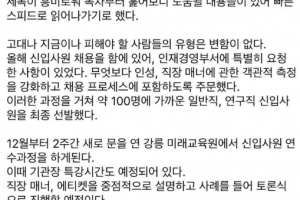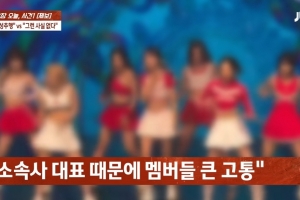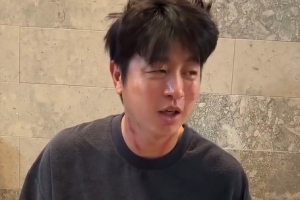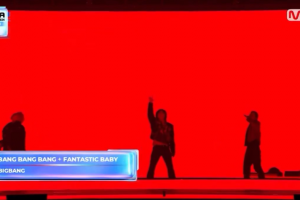그렇기 때문에 영화 ‘파리의 별빛 아래’는 지하의 센강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역설한다. 거기에는 정말로 크리스틴(카트린 프로 분)의 보금자리가 있다. 좋은 집은 아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없는 창고다.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파리에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크리스틴은 노숙인이니까. 낮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하고, 벤치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남이 버린 과학 잡지를 주워 읽던 그녀의 일상. 그런 크리스틴의 규칙적인 생활은 술리(마하마두 야파 분)의 등장으로 끝이 난다.
술리는 엄마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로 밀입국한 난민 소년이다. 한데 무슨 사연인지 지금은 엄마와 떨어져 파리 시내를 헤매다 크리스틴의 거처까지 오게 됐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얇은 옷을 입고 떠는 술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한 그녀는 딱 하룻밤만 재워 주는 거라며 철문을 연다. 이렇게 철문과 같이 마음의 문을 연 크리스틴이 결국 술리의 ‘엄마 찾아 삼만리’ 여정까지 따라나선다는 것이 ‘파리의 별빛 아래’ 내용이다.
이런 노숙인과 난민의 만남과 동행을 관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두 가지를 추천할 수 있겠다. 하나는 서로의 언어는 모르지만 소통은 능숙한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는 감상법이다. 술리는 크리스틴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크리스틴은 술리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때로 느낌이 주는 앎은 지식이 주는 앎보다 강한 힘을 낸다. 사회 맨 밑바닥에 있는 이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의식은 그럴듯한 배움이 아니라 생생한 감각의 교류에서 비롯된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