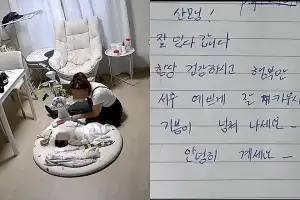연기자로. 또 일본에서는 가수로도 재능을 활짝 꽃피웠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가는 충격과 슬픔을 가눌 수 없었다. 지난 3월 세상을 등진 최진영에 이어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 연예가에서는 이런 ‘비보’가 줄을 이었다. 이은주. 유니. 정다빈. 안재환. 최진실. 장자연 등이 가족. 친지. 동료. 팬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기자 역시 사람인지라 이런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이들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나’라면서 때로는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마음속에 조용히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연예가의 사건. 사고를 보도해야하는 연예담당기자라는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수많은 취재현장을 다니지만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마음이 드는 곳은 없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장례식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장례식을 취재한 기사들에는 ‘과잉취재와 경쟁으로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는 요지의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조문 온 사람에게 쫓아가서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취재행태에 대한 지적부터 ‘장례식장에 노랗고 빨간 원색 옷을 입고 가다니. 도무지 예의 없는 것들’이라며 복장문제를 꼬집는 의견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입에 담기 힘든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며 기자들을 나무라기도 한다.
수긍이 갈만한 지적이다. 절친한 동료. 선후배를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연예인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조문온 연예인들의 모습과 말한마디를 담기 위해 끈덕지게 달라붙는 기자들을 보면서 “왜 꼭 저래야만 하나”라고 혀를 찰 만도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기자들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고인들의 연예활동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기사를 통해 팬들에게 이를 알리는 게 기자의 임무인 것처럼 고인의 마지막길을 팬들에게 전하는 것 역시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인을 사랑했던 팬들 중 장례식장을 직접 찾지 못한 많은 팬들은 기사를 접하면서 슬픔을 함께 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