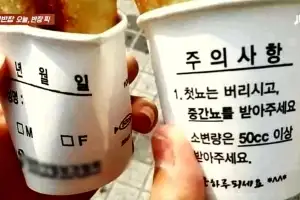→시사회에서 눈시울을 붉히던데, ‘어머니’를 본 느낌은.

→극장 개봉을 하는 심정도 남다를 텐데.
-태준식(이하 태) 제작과정에서 그분의 존재를 새삼 느꼈다. 영화를 찍고, 극장에 걸리는 건 수많은 시민의 십시일반 덕이다. 상업영화 중심의 배급체계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과제이지만, 여기까지로도 의미가 있다. 전태일에 관한 다큐와 극영화, 평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작품을 시작으로 어머니가 방송 다큐나 소설, 극영화로도 조명되리라 믿는다.
→인상 깊은 장면을 꼽는다면.
-공 장례식 장면에서 눈물이 흘렀던 건 이제 그만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삶이 너무 고단했다. 아드님을 만나러 가셔도 되겠다 싶더라. 어머니의 화법도 인상적이다.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 가서 “(크레인 위에 있으니) 땅바닥이 아니라서 건드리는 놈은 없겄제.”라고 한 부분을 보라.
-태 복사뼈에서 물을 빼러 병원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모양이다. (카메라) 찍지 말고 팔 좀 붙들어 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친해지기 전이라 범접하기 어려웠는데 순간 짠한 마음이 들었다. 다큐의 콘셉트를 어머니의 일상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순간이다.
→두 분 모두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고인과의 첫 만남을 떠올린다면.
-공 전태일의 40주기이던 2010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25~26년 전 평전을 준비할 당시에는 짧은 인사를 건넨 게 전부다). 종로구 창신동의 비좁은 집에 갔다. 방 한 칸에 부엌 겸 거실이 딸린 12평 남짓한 집이었다. 30평짜리에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태 2009년 2월쯤인가. 금융위기, 용산참사 등으로 피로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문득 뵙고 싶었다. (다큐 얘기를 꺼내니)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며 나무랐다. 워낙 겸손한 분인 데다 늘 담배를 피우고 (당뇨병과 고문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짜증도 냈는데 무시하고 1년쯤 드나들었다. 어느 순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더라. 안 오면 외려 심심해하고, 전화해서 심부름을 시켰다(웃음). 마지막 1년은 2~3일에 한 번꼴로 들렀다.
→2년여 동안 재밌는 일화도 많이 들었겠다.
-태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숨졌다. 장례식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당시 인권변호사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뜸 택시비 1만원을 빼앗다시피 해서 몸을 피했다. 훗날 청와대에서 만난 노 전 대통령이 “어머니, 빌려 가신 돈 갚으셔야죠.”라고 하니까, “옜다.”라며 쌈짓돈을 꺼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더라.
→무학의 40대 여성이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40여년 동안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았다. 네 차례 옥고를 치르고 200여 차례 연행되면서도 꺾이지 않은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공 1970년 당시 친척들은 이소선이 전태일을 죽게 만들었다고들 했다. 기질적으로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란 얘기다. 평전을 보면 전태일이 ‘나 떠나면 엄마가 해줘야 해.’라며 노동자 권리를 가르치는 대목이 나온다. 둘은 영혼의 쌍둥이이거나 동지다. 한 사람이 ‘이벤트’를 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이 뒷일을 책임지는 환상의 복식조라고나 할까.
고인의 배포를 말해 주는 일화는 많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김현옥 서울시장이 7000만원을 들고 와서 장례를 치러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인은 두 딸과 아들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오빠 시체를 내주면 너희는 공장을 안 다녀도 된다. 아니라면 너희는 공부를 안 시켜 줬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선택해라.’라고 했단다. 당시 7000만원이면 아파트 두 채 값이다. 돈도 돈이지만 경황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식들을 모아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도 대가 센 편이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다.
→평전을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공 다음 대선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관심이 없을 소재인데(웃음)…. 일본 식민지와 6·25전쟁, 봉건 소작농의 딸, 무능력한 남편, 무학 등 한국 빈민여성이 놓일 수 있는 질곡의 밑바닥에서 살아온 분이다. 그런데 어떤 지식인도 갖지 못한 지혜와 용기를 가졌다.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싶다. 전태일 기념사업회와 수익은 반씩 나눠야겠다. 하하하.
→영화를 누구에게 권하고 싶나.
-공 ‘노동자의 어머니’가 머리띠 두르고 연설하는 것만 봤지 고스톱도 치고 우스갯소리도 하는 평범한 할머니란 건 모르지 않나. 누가 보든 친근하게 감정이입을 할 것 같다.
-태 20대들이 봤으면 좋겠다. 검색창에 이소선 석 자를 쳐보게 한다면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멘토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죽음마저 극복하는 고인의 삶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위로받을 수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