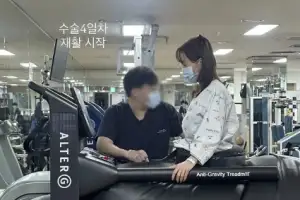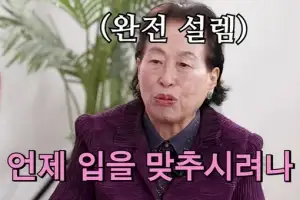문주는 전편에 이어 길게 찍기와 들고 찍기를 즐겨 사용한다. 그의 영화는 대상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소상하게 기록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50분의 상영 시간 동안 영화가 긴밀하게 기록하는 대상은 두 주인공이 아니다. 두 주인공의 관계에 집중하는 만큼의 시선을 바깥 인물에게 기울인다. 예를 들어, 여러 수난을 통과하는 사이에 알리나가 겪는 심경 변화는 수도원 여성들의 야단법석으로 표현된다. 사경을 헤매는 알리나의 모습 대신 병명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늙은 의사를 오랫동안 응시한다. 알리나가 시체로 누워 있을 때에도 불평을 길게 늘어놓는 여의사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심지어 알리나가 영화 내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녀의 표정은 카메라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신의 소녀들’은 고통받는 인물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체제에 관한 영화다.
극중 카메라가 그러하듯 고통을 주는 시스템은 고통받는 자의 표정과 심경에 무관심하다. 시스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호소하는 인간을 잠자코 머물게 하느냐.’에 있다. 시스템은 마음에 다가서지 못하고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그런 사회는 한 인간을 죽음에 다다르게 한다. 희망을 포기당하면 곧 죽는 것이다. 사회로 막 발을 떼려는 세대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문주는 결말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다. 차에 앉아 “사회가 엉망이다.”라고 시큰둥하게 내뱉는 경찰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줄을 지어 길을 건넌다. 아이들이 지나가자마자 경찰차의 창은 난데없는 흙탕물로 더럽혀진다. 그것은 곧 어린 세대의 야유이자 무언의 항변이다. 문주는 다음 세대를 억누르고 욕하기에 바쁜 기성세대가 수치심을 느끼기를 바란다. 더불어 방치된 청춘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두 번의 자장가로 고백한다. 6일 개봉.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