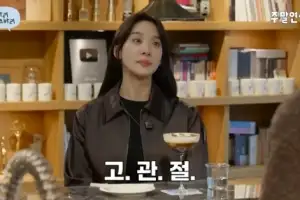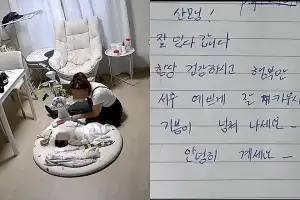강석필 감독과 홍형숙 프로듀서의 ‘춤추는 숲’은 일종의 ‘홈 비디오’다. 부부가 10년째 살고 있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이 일단 그렇다. 마을 풍경을 비추는 도입부가 단적인 예다. “파마하셨느냐”고 묻는 감독의 질문에 동네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짓고, 감독의 친구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낮술 먹고 들어가는 길이니 찍지 말라”며 너스레를 떤다.
형식도 마찬가지다. 감독이 찍은 HD 화면에 주민들이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덧붙여진다. 주민들은 빨래를 개면서 인터뷰에 응한다. 턱밑에서 인물을 찍기도 한다. 감독과 피사체 간에 내밀한 유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취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던 전반부와 달리 내용은 점차 무거워진다. 성미산 마을은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공동 육아를 모색하며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서교동 일대에서 시작한 공동체다. 2010년 홍익대 재단이 사범대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성미산 일대에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는다. 주민들은 산 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다. “약한 사람은 드러눕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천막에서 보냈던 이들의 목소리다. 관객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 천막은 쓰러진다. 150일 만에. 공사 부지 위로 나무는 넘어간다. 재독(在獨) 철학자 송두율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히스테리를 지적한 전작 ‘경계도시’(2002, 2009)처럼 부부는 결과보다 과정을 드러내는 데 천착한다. 현장 인부의 목장갑 낀 손이 렌즈를 가리는 숏이 대표적이다.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렌즈 너머의 표피가 아니라 이면에 도사린 질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한가.’
‘춤추는 숲’은 마을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다. 2편은 성미산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장담, 3편은 마을을 만든 어른들의 이야기다. 부부는 “‘경계도시’를 끝내고 큰 산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장의 치열함 대신 일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의도와는 달리 개발 사회의 광풍은 부부를 다시 현장으로 이끌었다. 남은 두 작품에서 우리는 오롯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상영시간 95분. 오는 23일 개봉.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