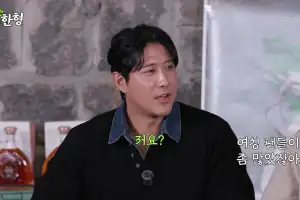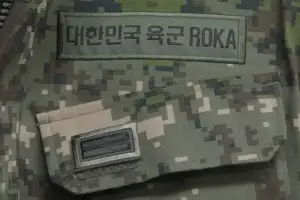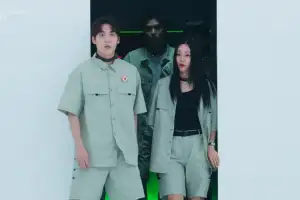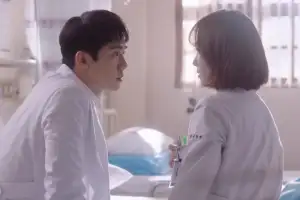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행복감. 그거야 한번쯤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느껴보았을 감정이다. 수많은 감독이 미묘한 감정을 영화로 옮기려 노력했으나 성공한 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장건재는 벌써 그 소수에 속해버렸다. ‘잠 못 드는 밤’은 사랑이라는 표현 불가능한 영역에 성큼 도달한 작품이다. 사랑과 행복의 느낌이 자연스럽고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오래전 아녜스 바르다의 ‘행복’(1965)을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하게 한다. 더불어 결혼한 사람들의 애정이 현실에 쉬이 자리를 내주는 것과 반대로 끝까지 행복의 순간을 움켜쥐는 커플의 모습에서 에릭 로메르의 ‘녹색광선’(1986)의 마지막 장면이 부럽지 않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배경으로 한 세 장면은, 바흐의 음악이 그러하듯 두 사람의 세상을 천상에 가깝게 올려놓는다. 바흐의 푸가에 따라 멋대로 춤을 추고 관계를 나누는 장면도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준다. 압권은 주희와 현수가 바깥과 맺는 관계를 그린 두 개의 꿈 장면이다. 두 개의 꿈은, 그들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젊은 부부의 성향을 솔직하게 전한다. 심지어 아이가 둘의 행복한 시간을 뺏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이다. 기성세대는 그들의 태도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영화는 젊은 부부의 모습에 구태여 거짓 양념을 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주희와 현수가 우리 곁의 여느 부부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행복한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두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 혹은 영원불멸의 연인으로 포장되지 않는다. 한때 머물렀던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이 기억하게 해줄 인물, 영화는 그 정도의 현실적인 꿈을 꾼다. 이토록 사랑스럽게 창조된 인물로 요란을 떨지 않는 젊은 감독의 공력이 대단하다. 그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갈망하던 진짜 사랑을 손에 쥐어봐서 그런지 나는 궁금하다.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