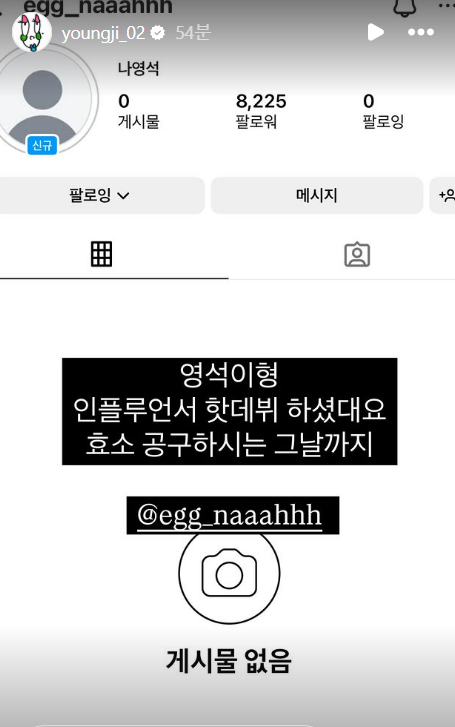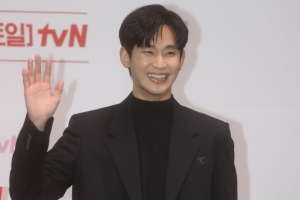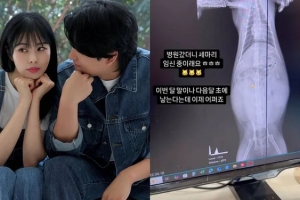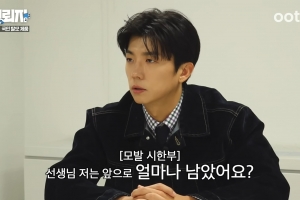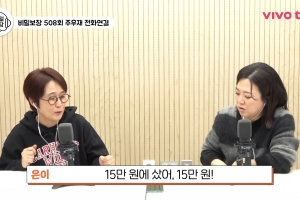→영화를 어떻게 기획했나.
-1980년대를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1990년대 초부터 기획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접었다. 2037년쯤에야 얘기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웹툰을 만들 생각이었다가 2011년 시나리오를 썼는데 위더스필름의 최재원 대표가 독립영화로라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 달 뒤 투자가 들어오고 주인공 송우석 역에 송강호가 캐스팅되면서 상업영화로 급물살을 탔다.
→왜 1980년대, 노무현이었나.
-고도 산업화 시대를 열고 민주화가 시작된 1980년대는 성장의 밀도가 가장 높았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뿌리도 80년대에 있었다.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았던 개개인의 삶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잉여’를 자처한 젊은이들이 조건에 따라 삶이 정해진다고 체념해 버리는 요즘 세태가 너무 아쉬웠다. 1980년대는 민주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독하게 열악한 시대였는데도, 구성원들이 악조건을 바꿔 가며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1980년대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변한 인물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나왔을 즈음 김재익 평전이 나와 기뻤다.

-미화는 끝까지 피하려고 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봤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이 꽤 있다. 국밥집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놓고 친구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감독으로 가장 공들인 장면인데 그때가 극중 송우석이 인간적으로 가장 약하고 밑바닥을 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순수하다고 좋아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다고 싫어한다. 그 나이에 요트로 진짜 올림픽에 나가려고 한 것이나 1990년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꼬마 민주당’에 남은 것이 순진한 측면 아니었나. 순수함과 순진함이라는 양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송강호의 연기가 8할을 차지하는 영화다. 연출의 주안점은 어디에 뒀나.
-1930년대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고전주의 영화처럼 주인공의 옆에서 걸어가듯 인물중심적으로 찍었다. 너무 세련되면 선동 영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약간 거리를 두고 투박하게 찍었다. 송강호는 대사의 행간까지 정확히 읽는 배우 그 이상이다. 자기 연기를 관객의 눈으로 객관화시켜 보는 능력까지 있다. 송강호는 배우이면서 대본이고, 관객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들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영화가 흥행했다는 시각도 있다.
-마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가끔씩 사회를 반영하고 사이렌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이렌이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지만, 불을 끌 수는 없다. ‘변호인’은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성찰에 관한 영화다. 극중 송우석과 차동영(곽도원) 경감은 둘다 신념을 지녔지만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의심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이 영화가 각자의 신념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