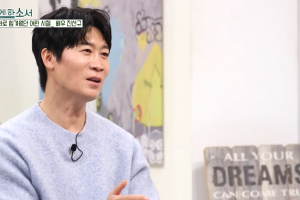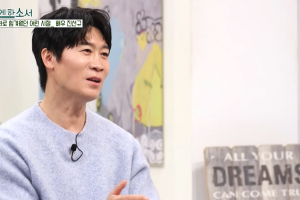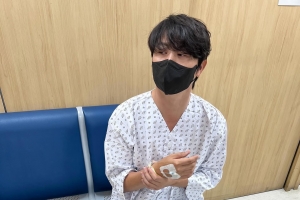다소 ‘올드’해 보이는 이 영화에 20~30대 관객이 몰리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휴전이나 전쟁에 대해 추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불과 10여년 전 벌어진 ‘연평해전’을 통해 군대 문제를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 영화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효자 아들로 나오는 박동혁 병장, 해군 출신 아버지의 속깊은 아들인 윤영하 소령, 곧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버지인 한상국 중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다. 영화를 본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월드컵 때 무관심 속에 외롭게 산화한 6명의 용사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진정한 의무를 생각하게 되는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사적인 공과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정치 논쟁은 국민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상처받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영화 이후 제2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처를 놓고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평론가 정지욱씨는 “‘변호인’이나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좌우 논리가 아니라 권력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홀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적 정서에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고, ‘연평해전’도 그런 맥락의 영화”라고 평했다. 다만 “관객 점유율이 20%에 그치는 평일에도 ‘연평해전’에 800~900개의 스크린을 잡아 주는 등의 몰아주기식 마케팅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