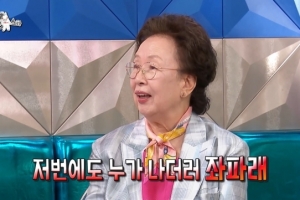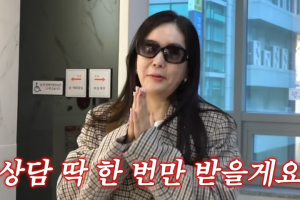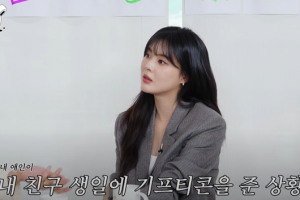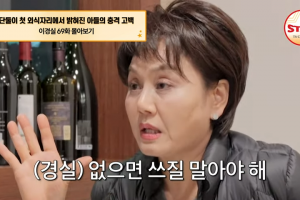보편적으로 중국 무협영화에서 드러나는 선과 악의 대립선은 뚜렷하다. 또 주인공은 절박한 상황에서 부족한 능력을 노력으로 채운 뒤 결국 갖은 걸림돌을 뚫고 악인에 대한 복수에 성공한다. ‘협녀’ 역시 여타의 무협영화들이 그랬듯 절정의 무림 고수들이 나와 하늘을 날아다니고, 화려한 검술이 곁들여지며, 주인공은 복수의 의지를 불태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협녀’는 박흥식 감독의 작품이다.
‘협녀’의 시대는 고려 후기 즈음이다. 문인들에게 무시당하던 무신들의 정권이 들어섰고, 타고난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도 있음을 확인하던 때다. 신분제의 고통과 귀족의 수탈로 기근에 시달리던 농민과 노비의 봉기가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다. 천민 출신으로 무림의 고수인 세 검객 풍천(배수빈), 설랑(전도연), 덕기(이병헌)는 백성들의 봉기에 앞장서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을 앞세운 덕기의 배신으로 좌절되고, 풍천은 죽음을 맞고 만다. 그리고 이들의 2세인 홍이(김고은)는 18년 동안 복수의 일념으로 검술을 수련하며 자란다. 실제 고려의 역사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만적의 난’(1198년)으로 통하는 노비해방운동 역시 또 다른 노비 동료의 배신으로 좌절됐다. 봉기를 모의했던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 등은 산 채로 강물에 던져졌다. 배신의 대가는 금 80냥과 자신 혼자 벗어던진 노비신분이었다. 비극적인 시대에 개인의 삶 또한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깊디 깊은 증오는 역설적으로 가없는 애정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다. 이룰 수 없는 애정이 커지면 연민이 되고, 연민이 깊어지면 증오로 바뀌게 마련이다. 또한 살부(殺父)의 숙명을 타고난 이에게 복수의 완성은 비극의 절정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홍이, 설랑, 그리고 덕기까지 각각이 져야 할 운명의 무게감은 너무도 크다.
박 감독은 돋보이는 미장센을 영화 곳곳에 적절히 배치했다. 탐미주의자로 오해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노란색과 연두색이 스크린 가득 하늘거리는 해바라기밭에서 뛰노는 홍이의 모습은 복수의 감정을 뛰어넘는 순수함을 상징한다. 또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밭을 지르밟으며 병사들과 맞서는 장면은 설랑의 북받치는 슬픔과 대비되며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한다. 이 밖에도 제 어미 설랑에게 검을 겨눠야 하는 홍이의 가슴 속 격동을 대변하듯 출렁이는 갈대밭, 그리고 몇 줄기 희미한 햇볕만 겨우 스며든 대나무 숲 속 검푸름도 ‘협녀’의 색채 영상미학을 유감없이 자랑한다. 마지막 장면, 사르락 사르락 눈 내리는 밤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의 애증의 운명은 한껏 끌어올린 비장미의 정점을 찍는다. 13일 개봉. 15세 관람가.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