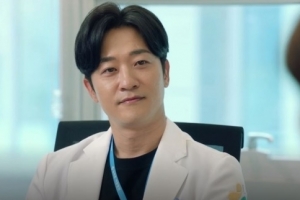마일스 데이비스는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다. “1975년부터 1980년 초까지 나는 트럼펫을 잡지 않았다. 다시 말해 4년이 넘게 단 한 번도 잡지 않았다. 지나가다 트럼펫을 보면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런 일도 없어졌다.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란 대개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했고, 돌이켜봐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죄의식도 없다.”(성기완 옮김, ‘마일스 데이비스’ 중에서) 30년 넘게 재즈를 연주하며 살아온 유명 뮤지션이 트럼펫을 내려놓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음악이 자신의 전부라던 남자가 활동을 중단하고 대체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마일스‘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영화다. 마일스를 연기하고 ‘마일스’를 감독한 돈 치들은 그 시기를 마일스의 암흑기가 아니라 전환기로 그려낸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 자체를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마일스는 1981년 음악계에 복귀한다. 마일스 생애 일부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영화가 그의 삶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영화에서 관건은 마일스의 방황하는 나날과 각성의 계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이해한 돈 치들은 마일스의 공백기에 대한 픽션적 상상―창조적 해석을 시도한다. 두 사람을 등장시켜, 칩거 전후 마일스의 상황을 각각 과거와 현재에서 보여준다. 한 명은 마일스의 연인이었던 프랜시스 테일러(이마야치 코리닐디), 다른 한 명은 롤링스톤 기자인 데이브 브래든(이완 맥그리거)이다.
프랜시스는 실존 인물이다. 그녀는 마일스가 1961년 발표한 앨범 ‘섬데이 마이 프린스 윌 컴’ 표지 사진 주인공이기도 하다. 프랜시스와 사랑을 나누던 그때는 그에게 좋았던 옛날을 의미한다. 그녀와 헤어진 뒤 마일스는 자서전에서 후회를 내비친다. “프랜시스는 이제까지 내 아내 중 최고였고, 그녀를 얻는 사람은 누구라도 더럽게 운이 좋은 것이다. 지금에 와서야 알았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데이브는 가상 인물이다. 그는 프랜시스와 결별하고 집에 틀어박힌 마일스를 찾아온다. 마일스가 새 앨범을 녹음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에 대한 단독 기사를 쓰기 위해서다. 그의 미발표 앨범은 정말 존재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앨범을 훔쳐가 버리고, 마일스와 데이브는 앨범을 되찾으려고 동분서주한다.
추억과 추격을 교차하며 ‘마일스’는 마일스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는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쌍둥이자리로 태어난 마일스는 자기 안에 두 명의 자아가 산다고 믿었다. 코카인에 중독된 다음에 그는 자기 안에 네 명의 자아가 있음을 느낀다. 긍정할 수 있는 ‘나’와 부정하고 싶은 ‘나’까지 전부 마일스다. 그러니까 그의 곡에는 그들이 담겨 있다. 마일스 음악은 마일스들 사이의 대화와 다툼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으므로, 언제나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았을 것이다. 한순간도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10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컬럼니스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