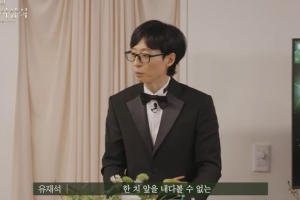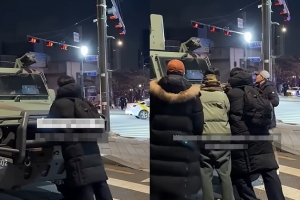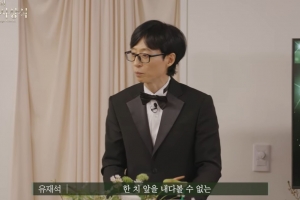마이클 무어 감독이 돌아왔다. 그의 이번 타깃은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다. ‘화씨 11/9’라는 제목부터 그렇다. (부제 ‘트럼프의 시대’는 한국 배급사에서 붙였다.) 재작년 11월 9일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 날이다. 그러니까 화씨 11/9는 그때부터 진실을 말소하는 정치 온도가 한층 더 높아졌음을 가리킨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것은 무어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영화 ‘화씨 9/11’(2004년 개봉)의 숫자만 뒤집어 놓은 타이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전작의 맥락과 의미를 잇는 후속작이란 뜻이다.
우선 무어는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를 따져 묻는다. 정치 전문가 중 그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우연처럼 보인다. 어쩌다 보니 다양한 상황이 기묘하게 맞물려 그가 집권하게 됐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무어도 모든 것이 싱어송라이터 그웬 스테파니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 사정은 이렇다.
2015년 당시 스테파니는 트럼프보다 방송 출연료를 많이 받았다. 이 사실에 트럼프는 자존심이 상한다. ‘어떡하면 내가 훨씬 유명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거대한 쇼를 연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짜 대통령 출마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고용한 엑스트라들을 자기 지지자로 꾸며 유세까지 했다.
이후 과정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그의 쇼는 현실이 됐다. 관객에게 무어는 다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는 우연뿐 아니라 여러 필연도 작용했다고. 두 가지만 꼽아보자. 하나는 언론사,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다. 언론사는 트럼프의 온갖 자극적인 언행을 앞다퉈 보도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담합해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당도 비슷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경선 투표 집계까지 조작했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 열풍을 협잡으로 억누른 민주당은 ‘민주’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러니 미국에 트럼프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를 놓고 봐도, 그의 시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어는 트럼프의 전제주의 행태를 경고한다. 동시에 그는 불의에 굴복한 미국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미국의 미래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영화 곳곳에 무어는 그럴 수 있는 잠재성을 배치해뒀다. 예전에 그가 책에 썼던 구절이 힌트가 될 듯하다.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이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세상에 부딪쳐라 세상이 답해줄 때까지’ 중) 변화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진실을 말소하는 정치 온도를 내린다. 무어는 강력 냉각제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