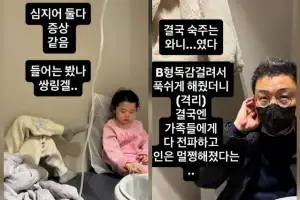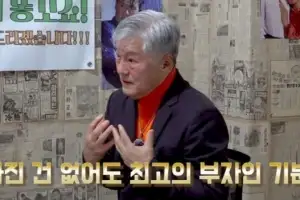‘이방인들’의 인물들은 모두 상실의 아픔을 겪은 존재들이다. 상실을 주제로 다룬 독립영화는 흔하다. 대다수 감독은 상실이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실이란 소재에 연연한 영화는 거두는 것 없이 우울한 정서만 전달할 뿐이다. ‘이방인들’은 그런 영화들의 실패에서 잘 벗어난 작품이다. ‘이방인들’의 마법 중 하나는 공간에서 비롯된다. 공간이 품은 정서가 인물에게 전이될 때, ‘이방인들’은 진심의 카드를 펼쳐 보인다.
‘이방인들’은 부산이면서 부산이 아닌 김해를 무대로 삼았다. 겉보기에 한가하고 오염되지 않은 삶이 연출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김해는 부산에서 낙후된 지역에 해당한다. 연희가 강 건너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마을(사실은 거기도 부산 변방이지만)을 바라볼 때, 김해는 소외당하고 박탈당한 공간으로 자리한다. 불에 탄 공장, 인적이 드문 마을, 잡초가 무성한 시설, 신도가 사라진 교회 등은 김해가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입맞춤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방증한다.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조차 슬픔이 비집고 나오는 곳, 그래서 욕심 많은 도시인이 살 만한 곳은 못 된다.
김해가 그렇듯, ‘이방인들’에는 떠밀려온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왠지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연희는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고, 석이는 무작정 머무르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는 죽어 그곳에 묻혔다. 계속 떠나기를 시도하는 은임이 언제 길을 찾을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연대한다. 이방인으로 만난 그들은 마음을 여는 것으로 서로 슬픔을 달랜다. 그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놀라는 법이 없다. 먼저 말을 걸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삶의 방식이다. ‘이방인들’을 보고 나오면서 위안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최용석이란 이름을 기억하기로 했다. 10일 개봉.
영화평론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