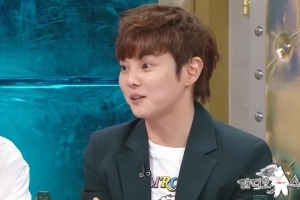‘최 경위 유서’
최 경위 유서가 공개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최 모(45) 경위가 남긴 유서가 14일 공개됐다. 유서에는 청와대의 회유 시도를 시사하는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 경위의 형 요안(56)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일동성당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회유하려 했다. 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기에 세상에 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유서를 공개한다”며 최 경위 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최 경위 유서는 14장 가운데 유족들에게 남긴 내용을 제외한 8장 분량이다.
유서는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2명,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분실 동료 한 모 경위,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형식이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경찰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회한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BH의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다”며 “단지 세계일보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제가 이런 힘든 지경에 오게 되고 조선일보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털어놨다.
최 경위는 동료 한 경위에게는 “저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거래를 제안했음을 시사했다.
최 경위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부디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하 최 경위 유서 전문.
<1~2장>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께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저를 비난하고 덫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경찰생활하며 16년 동안 월급만 받아 가정을 꾸미다보니 대출끼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습니다.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기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4장>
제가 정보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지만 그 중에서 진정성이 있던 아이들은 세계일보 A와 조선일보 B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타에서 “BH의 국정농단”은 저와 상관없고, 단지, 세계일보 A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제가 이런 힘든 지경에 오게 되고 조선일보 B는 제가 좋아했던 기자들인데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이자 아우인 C가 저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멸시와 경멸은 참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진실은...
세계일보 A 기자도 많이 힘들텐데 “내가 만난 기자중, 너는 정말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동생이었다. 그동안 감사했다.”
<5~6장>
C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이다.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 너무 힘들었고 이제 편안히 잠 좀 자고 쉬고 싶다. 사랑한다. C야.
절대 나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너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그리고 부탁하건데 내가 없는 우리 가정에 네가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C야 아는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사랑한다. C야..
<7~8장>
언론인 들어라
훌륭하신 분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생활하시죠.
저널리즘! 이것이 언론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짓눌러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진=서울신문DB(최 경위 유서)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