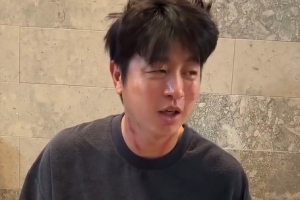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아니다. 둘 다 다른 한계들이 있을 것이다. 서면으로라도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다.
→“영화는 언어적인 속박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보려는 일”이라고 한 적이 있다. 영화가 언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나.
-논리적인 말이나 글은 그대로 또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예술이 제대로 작동할 때 예술이 수용하는 삶의 폭이 더 크고, 그 폭 안의 ‘어떤 하나의 본질’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 폭 전체를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던 학생이 추천서를 부탁한 일 등의 경험에서 영화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자전적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는 편인가.
-영화를 보고 후기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 영화에선 둘(작품과 감독) 사이의 관계가 딱 그만큼이었다. 영화마다 좀 더 가깝기도 하고, 좀 더 멀기도 하고 다르게 관계 지어진다. 만드는 사람이 하는 일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직간접으로 경험한 재료들(어디서 읽은 소설의 한 구절, 어떤 그림에서 얻은 하나의 감흥, 아침에 나눈 처와의 대화, 오랜만에 찾아온 옛날 학생의 부탁 등등)을 새로운 배열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구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선희’에서도 장소를 가장 먼저 정했나.
-맞다. ‘아리랑’이란 카페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거기가 처음 정해졌고, 그다음은 ‘학교에 와서 추천서를 받는 선희’란 게 촬영 직전에 정해지면서 학교 캠퍼스가 정해졌다.
→우연과 직관에 기대어 영화를 찍지만 선희를 빼고 세 남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마지막 장면은 미리 염두에 두었을 법하다.
-그날이 고궁 신인데 그때까지 인물들이 영화 안에서 다 모인 적이 없었고, 촬영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배우에게 모두 대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보신 그 구체적인 신들은 그날 아침 대본을 쓰면서 정해졌다.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 ‘옥희의 영화’ 등에 출연했던 이선균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름만 달라졌지 같은 인물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희란 이름은 전에 정유미씨가 나온 ‘옥희의 영화’의 옥희란 이름 때문에 좀 힘들게 지었다. 옥희란 이름의 힘이 좀 저한테 셌던 것 같다. 문수는 쉽게 좋게 나왔고, 재학도 나오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정유미씨와 이선균씨가 같이하기로 정해지면서 두 사람의 인물로서의 관계가 전에 같이 나온 영화 ‘첩첩산중’이나 ‘옥희의 영화’와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것인가 저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른 것들이 다르니깐, 그건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가도 상관없다, 그런 맘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만 해도 꿈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선희’에는 꿈이 등장하지 않는다.
-글쎄. 그냥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때 나오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필요는 하여간 그때그때 다른 필요였던 것 같다.
→재학과 키스를 한 선희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비춘다.
-선희가 바쁘게는 돌아다니지만 선희 혼자 있는 신은 그때까지 별로 없었다. 재학과 헤어지고 나서 일단 세 남자 사이를 한 바퀴를 돈 거니깐, 그때쯤 선희 혼자의 모습을 길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언덕을 내려가는 선희를 보면서 선희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내게는.
→‘홍상수’에 대해 추천서를 쓴다면.
-그냥 간단히 쓰겠다. “맘에 거슬리는 게 없는 상태를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