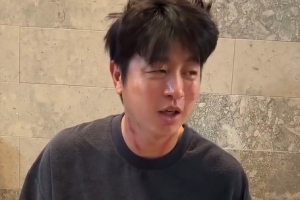위안부 피해자는 역사 속 박제화된 과거가 아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지난 22일로 1149회 차를 맞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은 공식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 같은 민간인조차 이 문제에 대해 ‘정신대는 상냥한 명칭’, ‘유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아픔이건만 그저 우리만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피상적인 이해가 있을 뿐이거나, 아니면 소 닭 보듯하며 지겨워하고 있을 따름이다.
소리굽쇠는 지워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자 더 이상 잊고 지내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연출을 맡은 추상록 감독은 물론 배우진, 제작진 등이 모두 재능기부(무보수)로 힘을 모았다. 심지어 또 다른 위안부 피해 국가인 중국의 배우, 제작진까지 재능기부로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다짐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영화는 해방된 뒤에도 고향 밀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 조선족이 돼 버린 위안부 피해자 귀임 할머니(이옥희 분)와 손녀 향옥이(조안 분)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풋풋한 연정을 나누던 소년은 관동군으로, 소녀는 위안부로 끌려간다. 은근하면서도 멀리 퍼지는 소리굽쇠를 하나씩 나눠 가진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한다. 사랑의 징표인 소리굽쇠만이 남아 간직된다. 그들이 못다 이룬 사랑은 자손대에 이르러 완성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무지는 역사 속 가해자의 인식과 맞닿는다.
영화의 마지막 반전에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다가 이윽고 먹먹해진다. 여기에 누군가는 작위적이라는 시각을 던질 수 있다. 오로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그리는 영화로만 본다면 물론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옭아매는 모순은 늘 고정된 틀 속에서 악마화한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음을, 무관심과 무지가 언제든지 가해의 형태와 주체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한·중 합작 영화 제작 사례 중에서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배우, 제작진, 촬영 로케이션 비율 등을 충족시킨 첫 번째 작품이다. 중국의 1급 국가배우인 조선족 이옥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 30일 개봉. 15세 관람가.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