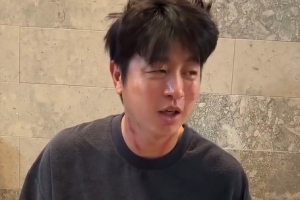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이 영화는, 이렇듯 현재의 나처럼 무기력과 자포자기 뒤에 숨어 버린 어른들과, 과거의 나처럼 가슴을 쥐고 아파하면서도 용기 내어 전진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한 위로와 응원의 편지다.” 그녀의 의지와 낙관은 영화 곳곳에 섬세하게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이러한 장면을 보고 나면 “다시 진심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전언에 동감하게 된다.
동생 윤의 눈이 멍들어 있다. 친구 연호에게 맞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윤은 연호와 재미있게 놀았다고 헤헤거린다. 누나 선은 화가 나 윤에게 따진다. “너 바보야? 그러고 같이 놀면 어떡해? 다시 때렸어야지!” 그러자 윤이 선에게 반문한다. “그럼 언제 놀아? 친구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친구가 때리고,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우리들’이 관객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윤의 이 말이다. 계속되는 폭력의 순환을 멈추는 결단이야말로, 홀로 존재하는 개체를 우리들이라는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진리가 그들의 전쟁터, 초등학교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선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있다. 그 사실을 부모와 교사만 모른다. 영화에서도 실제에서도, 어른은 어린이의 조력자이기보다 방관자로서 말하고 행동한다. 아이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한다. 학교의 배틀로열적 면모는 ‘우리들’의 체육 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은 상대팀을 공으로 맞혀 한명씩 ‘죽이는’ 피구 경기만 한다. 누가 뽑았는지도 모르는 리더가 팀원을 고르는 방식, 그리하여 소외되는 아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 불만을 내비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이 실천할 수 있는 진리의 범위는 제한된다. 친구 지아가 피구 경기장의 금을 밟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 정도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다. 한데 그것만으로는 너와 내가 우리들이 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의 벽을 넘거나 부수지 못한다. 관계는 체제의 산물이다. 체제를 바꿔야 관계도 바뀐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세계(The world of us·‘우리들’의 영어 제목)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오는 16일 개봉. 전체 관람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