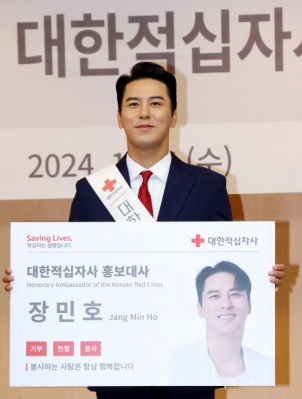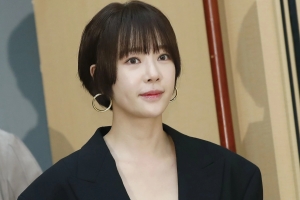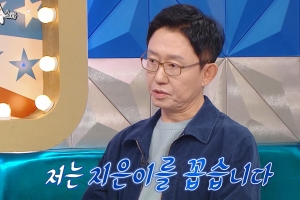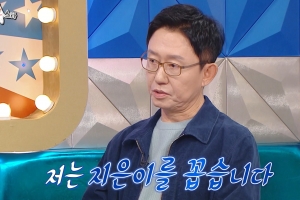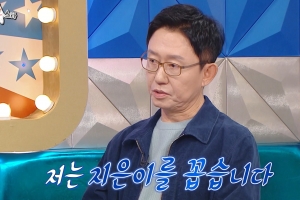‘택시 운전사’는 2003년 송건호 언론상을 받은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의 수상 소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힌츠페터는 목숨을 건 잠입 취재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그는 당시 광주 잠입을 도와 줬던 택시 운전사 김사복을 애타게 찾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이 같은 이야기를 극화한 ‘택시 운전사’는 기어를 ‘버디 무비’에 넣고 운행을 시작한다. 영화 초반에는 사우디에서 5년간 벌어 온 돈을 아내의 병수발로 소진하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으로 장만한 택시를 60만㎞나 운행하며 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소시민,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택시비가 없는 승객에게 험한 소리 못하는 서울의 택시 운전사 만섭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할애한다. 밀린 사글세 10만원을 벌어 볼 요량의 만섭이 계엄령으로 외부와 단절된 광주에 가려는 독일 기자 피터와 동행하며 영화는 속도를 낸다.
원맨쇼에 가까운 송강호의 연기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입이 아프다. 너무나 독보적이라 토마스 크레취만이 연기한 독일 기자 피터가 평면적으로 비칠 정도다. 40년 전 붉은 피가 꽃잎처럼 뿌려진 금남로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실제 크기의 세트장을 지을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다. 광주뿐만 아니라 당시 브리샤, 포니 택시가 오가는 시대상을 충실하게 되살린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됐다.
137분에 달하는 영화에서 50분가량 지나고 나서야 카메라가 광주역 광장으로 진입하며 군중을 만난다. 관객들의 가슴을 쿵쾅쿵쾅 방망이질하는 순간이다. 카메라는 불타는 광주MBC를 거쳐 클라이맥스인 금남로에 다다른다. 소시민인 만섭은 큰 사명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지만 보편적인 인류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다. 어쩌면 이 영화는 동시대를 살았던 이방인의 부채 의식이 투영된 작품일지도 모르겠다.
광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진즉부터 엄숙함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경쾌한 템포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사’도 이러한 흐름에 발을 걸치고 있기는 한데, 김사복을 그리워하는 생전의 힌츠페터 인터뷰가 곁들여진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엄습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다. 8월 2일 개봉. 15세 관람가.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