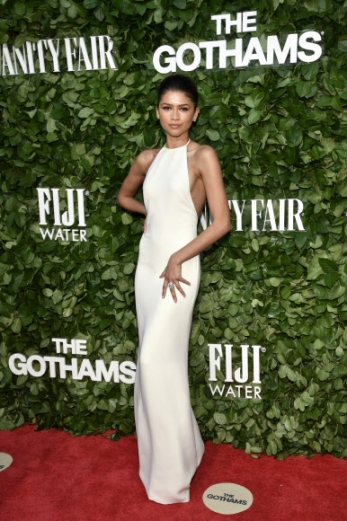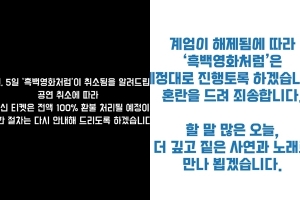‘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다. 지난해 출간된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2017년 한국 문학이 거둔 성취를 돌아볼 때, 나는 이 작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주인공은 30대 딸을 둔 60대 여성이다. 원래 모녀는 따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경제적 사정으로 엄마 집에 들어오게 된다.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딸의 동성연인도 한집에서 살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목은 ‘딸에 대하여’지만, 실은 이 소설은 “내 피와 살 속에서 생겨나고 자라난 딸이 어쩌면 나로부터 가장 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엄마의 이야기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영화 ‘환절기’를 보면 좋을 듯하다. 두 작품에 공명하는 지점이 있어서다. 주인공은 20대 아들 수현(지윤호)을 둔 50대 여성 미경(배종옥)이다.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들의 절친한 친구이던 용준(이원근)과도 살갑게 지냈다. 그런데 미경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수현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이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용준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 말이다. 미경은 당혹스럽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자신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 수현과 용준이 맺은 관계가 우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부제는 ‘아들에 대하여’로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목은 “아들인데도 너무 몰랐나 봐.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전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라고 한숨을 내쉬는 엄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딸에 대하여’나 ‘환절기’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식 즉 타인과 내가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질문한다. 제일 쉬운 방안은 무시나 거부하는 태도다. 하지만 엄마에게 딸이나 아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배제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엄마는 자식을 필사적으로 ‘번역’(translation)하려고 애쓴다.
번역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아래에 가만히 서서 나보다 위에 위치한 타인을 순순히 따르는 행위인 이해(under+standing)와 구별하려고 쓴 표현이다. 번역은 ‘~을 통해서 ~에 이르는’ 횡단 과정이다. 이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설과 영화에서 엄마는 자식이라는 원어를 자기만의 역어로 옮긴다. 비평가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번역가의 과제는 그가 번역하고 있는 언어에서, 그 언어를 통해 원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찾아내는 데 있다.” 엄마는 서툴지만 ‘원문의 메아리’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녀도 성실하게 번역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딸과 아들의 책무다.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