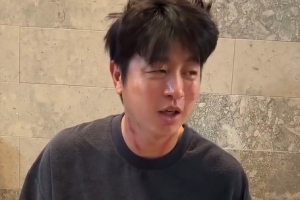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인간 위해 만든 인공인간 일자리 위협
2200년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인간, 즉 복제인간으로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다. 인간들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로 만들어진 ‘인공’은 원본 인간의 건강을 위해 이용되고, 그 전까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 근로에 투입된다. 편의점의 ‘1+1’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우연히 동행하게 된 두 구직자에게도 사연은 있다. 진짜 인간(정경호 분)은 아픈 아이의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고, 청년 인공(강유석 분)은 원본 인간의 보험 해지로 인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처지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공을 만들었지만, 인간도 인공도 편치 않은 것이 220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공은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인간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인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매매하게끔 내몰린다. 인공은 인간의 지위를 사 ‘진짜 인간’이 되는 데 혈안이 된다.
황승재 감독은 영화 중간중간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물으며 약 100명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했다. 여기서 영화는 SF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다. 인터뷰이들은 각자 삶, 죽음, 행복,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생각들을 이어 나간다.
배우 봉태규도 인터뷰이 중 한 명으로 등장해 삶이 거듭되어도 더 나은 방책이라는 것은 없더라는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심지어 2200년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21세기 현재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는 것도 사람들이 21세기를 유토피아로 상정한 탓이라는 데서는 맥이 탁, 풀린다. 지금도 힘든데, 200년 후에는 지금을 그리워한다.
●인터뷰이 100명에 듣는 인간 존재 의미
인간도 인공도, 200년 후에도 처절하게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통해 영화는 우리가 영원히 쓸모를 고민하는 구직자임을 일깨운다.
황 감독은 “용도를 정해 두고 만든 게 복제인간인데, 인간 역시 쓸모 있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가 비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타개책까지는 내놓지 않지만, 인터뷰이 100명의 대답들 속에서 각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오는 12일 개봉. 전체 관람가.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