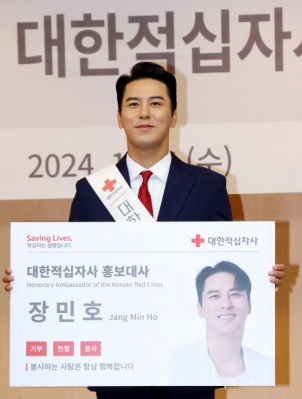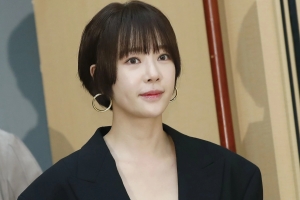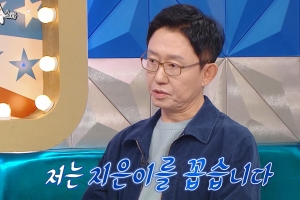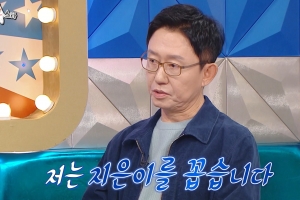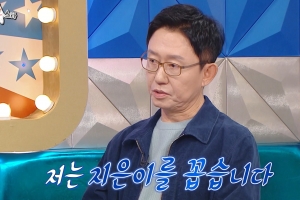작가적 자의식 작품에 담아
‘취화선’ 칸 감독상… 세계적 반열

1950년대 중반 한국영화 제작이 활기를 띠면서, 임권택도 우연한 기회에 영화계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로 올라간 군화 장사꾼들이 ‘장화홍련전’(정창화, 1956)을 제작했는데, 영화 일을 도와달라며 그를 부른 것이다. 처음에는 제작부 일과 소품 담당을 하다, 정창화 감독의 연출부에 들어가며 어깨너머였지만 연출을 배우기 시작한다.
28세였던 1962년 만주웨스턴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고,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많을 때는 한 해 7~8편을 만드는 직업 감독으로 다작의 시기를 거쳤다. 주로 사극과 액션, 전쟁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충무로 시스템에 순응한 감독이었지만, 대신 장르영화의 대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영화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은 52번째 연출작 ‘잡초’(1973)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을 계기로 그는 작가적 자의식을 영화에 투영하기 시작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인터뷰집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하다’(현실문화연구, 2003)에서 그는 “‘잡초’가 내 삶에 애정을 갖기 시작한 영화라면 ‘왕십리’는 내 살고 있는 땅을 사랑하기 시작한 영화”라고 말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영화계는 이장호, 하길종 등 ‘영상시대’ 감독들이 새로운 한국영화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구석에 몰린 느낌”을 받았다던 임권택의 회고에서, 당시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의 뼈아픈 고민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왕십리’(1976)는 ‘별들의 고향’(1974), ‘바보들의 행진’(1975) 등 1970년대 ‘청년영화’들에 대한 그의 대답과도 같은 영화다.
이후 그는 ‘족보’(1978), ‘짝코’(1980), ‘만다라’(1981), ‘안개마을’(1982), ‘길소뜸’(1985) 등 작가주의 감독 임권택으로 평가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의 삶이 반영된 한국적인 주제를 놓고 조심스럽지만 치열하게 ‘한국’영화를 찾아가던 때인 것이다. ‘서편제’(1993)로 한국영화사상 최초의 100만 흥행에 성공한 후, ‘춘향뎐’(2000)의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취화선’(2002)의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계기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2014년 김훈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배우 안성기가 합류한, 102번째 작품 ‘화장’을 연출했다. 임권택은 한국영화의 역사,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