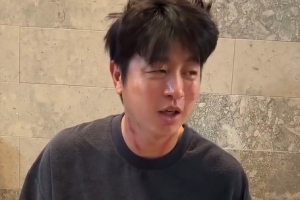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뉴스데스크’ 제작진과 왕종명 앵커가 배우 윤지오에게 공식 사과했다.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19일 “‘뉴스데스크’는 어제(18)일 방송에서 故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생방송으로 인터뷰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왕종명 앵커가 정치인의 실명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한 부분이 출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례하고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왕종명 앵커와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이러한 시청자 여러분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사자인 윤지오씨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오늘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릴 예정”이라면서 “MBC 뉴스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비판에 늘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왕종명 앵커는 윤지오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를 향해 “술자리 추행 현장에 다른 연예인이 있다고 했다.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윤지오는 “증언자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 뒤 “그 분께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왕종명 앵커는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서에 방씨 성을 가진 조선일보 사주일가 3명과 이름이 참 특이한 정치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진상조사단에서 말을 했으냐”고 물었고, 윤지오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왕 앵커는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지오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행에 시달리고, 몰래 수차례 이사를 한 적도 있고, 결국엔 해외로 도피하다시피 갈 수 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있다. 해외에서 귀국을 하기 전에도 한 언론사에서 저의 행방을 묻기도 했다.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두 차례도 있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장시간을 대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 분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명 공개 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분들이 고소를 하면 저는 더이상 증언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그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 저는 그분들에게 단 1원도 쓰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지오의 말에도 왕종명 앵커는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으로는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 진상조사단에 처음에 나갔을 때 말 안 했다가 이번에 명단을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말한 것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진실을 밝히는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며 재차 실명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지오는 “발설하면 책임져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왕종명 앵커는 “저희가요? 이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이라고 말하자 윤지오는 쓴웃음을 지으며 “안에서 하는 것은 단지 몇 분이고, 그 이후 나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 일관되게 말했다. 이 부분에서 검찰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 맞다. 저는 증언자로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왕종명 앵커는 “무슨 입장인지 충분히 알겠다”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이하 MBC ‘뉴스데스크’ 윤지오씨 인터뷰 관련 제작진 입장>
‘뉴스데스크’는 어제(18)일 방송에서 故 장자연의 친구 윤지오씨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데스크’ 제작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아 래>
어제 ‘뉴스데스크’는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생방송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종명 앵커가 정치인의 실명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한 부분이 출연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례하고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왕종명 앵커와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이러한 시청자 여러분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사자인 윤지오씨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오늘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비판에 늘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