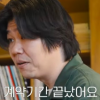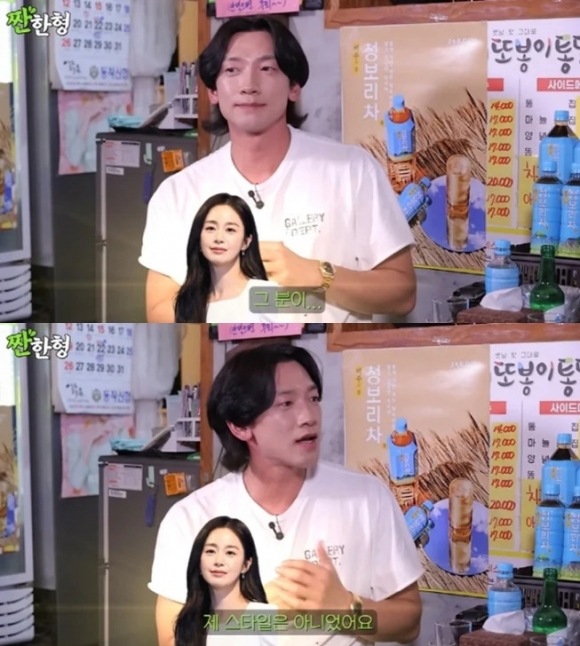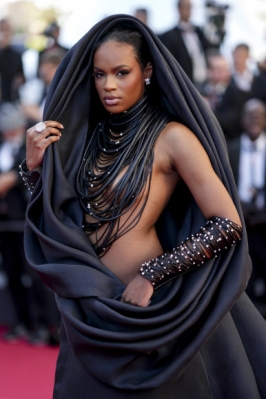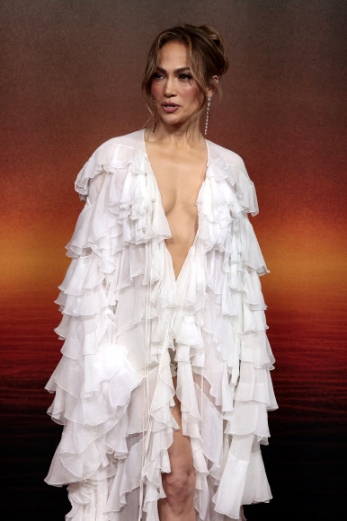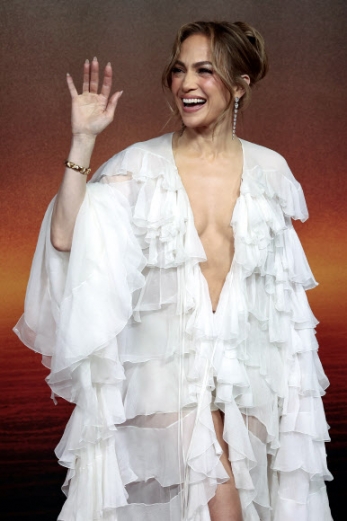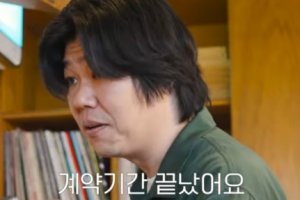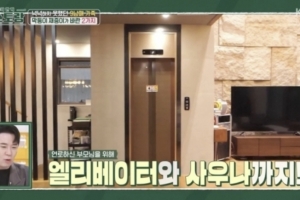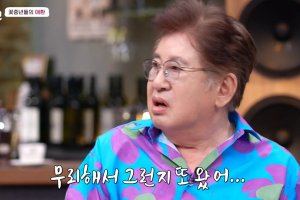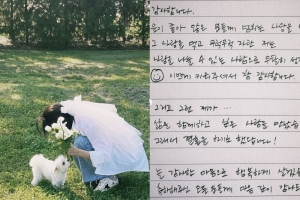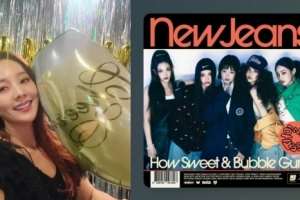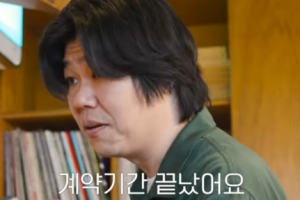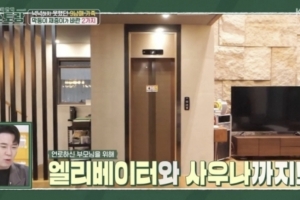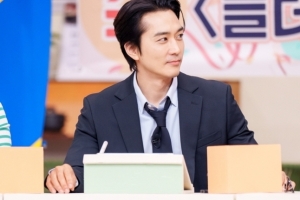다음달 5일 개봉하는 ‘45년 후’의 원제는 ‘45 Years’이다. ‘45(주)년’이라고 옮겼어야 하나, 한국 제목에는 ‘후’를 더했다. 그렇지만 뒤나 다음을 뜻하는 명사를 덧붙이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케이트와 제프는 아직 45년을 같이 살지 않았다. 영화는 결혼 45주년을 닷새 앞둔 월요일에 시작해, 축하연이 열리는 토요일에 끝난다. 그 기간이 채워져야 비로소 부부는 45년을 해로한 것이 된다. 앤드류 헤이 감독이 초점을 맞춘, 바로 이 시점을 생각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후’를 넣으면 45년이라는 세월은 동결되어 외따로 떨어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45년은 순수한 사랑의 결정(結晶)이 아니라, 혼란과 갈등이 뒤섞인 결혼의 자취이기 때문이다.
죽은 카티야가 갑자기 케이트와 제프의 삶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에 균열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조명되지 않은 부부의 과거?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내내 장밋빛이었음을 입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균열은 느닷없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관계이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므로, 균열은 이미 내재될 수밖에 없다. 케이트가 토로한다.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것은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사랑이 굳건하다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되풀이하다보니 어느새 45년이 된 것이다. 제프가 술회한다. “늙으니까 자꾸 목적의식을 잊게 돼.” 이 또한 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반복되어 쌓이는 나날을 보내며, 우리는 사랑을 비롯한 무엇인가를 계속 잃는다. 시간은 에누리가 없다. 15세 이상 관람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