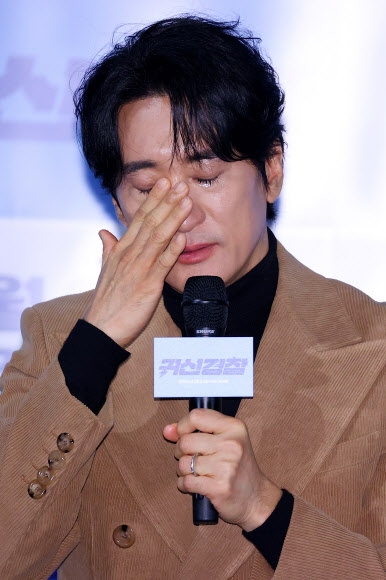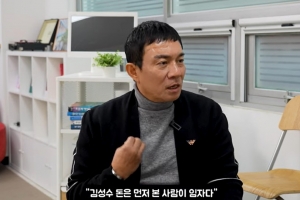영화 바탕에 깔려 있는 세계관은 복잡하지만, 스크린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 한때 운동권이었으나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테오(클라이브 오언)에게 전 부인이 접근한다. 피시단 리더인 줄리언(줄리언 무어)이다. 둘은 아이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줄리언은 푸지 신분인 흑인 소녀 키(클레어-홉 애시티)를 해안가까지 데려갈 수 있게 여행증 발급을 도와달라고 제안한다. 알고 보니 이 흑인 소녀는 임신한 상태다. 줄리언은 과학자들이 인류 문명 복원을 위해 꾸리고 있다는 휴먼 프로젝트에 키를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피시단의 내부 분열로 흑인 소녀의 앞날은 테오에게 맡겨진다.
‘칠드런 오브 맨’은 우리 현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1982)와 비교되기도 한다. ‘그래비티’ 도입부에서 17분가량의 압도적인 롱테이크 장면을 선사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이 작품에서도 롱테이크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영화 중반 줄리언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장면에서 5분가량 롱테이크가 맛보기 격으로 등장한 뒤 영화 말미에 10분이 넘는 장엄한 롱테이크가 이어진다. 테오가 키를 구하기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시가지를 헤치고 다닌다. 테오와 키가 아이를 안고 폐허의 건물을 나서며 총성이 멎는 장면에선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다.
‘그래비티’에서 ‘버드맨’, ‘레버넌트’까지 3년 내리 오스카 촬영상을 수상한 에마누엘 루베즈키 촬영감독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함께 빚어낸 놀라운 장면이다. SF지만 화려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비트는 등 심오하기까지 하다. 관객에 따라서는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막판 롱테이크 장면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 22일 개봉. 15세 관람가.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