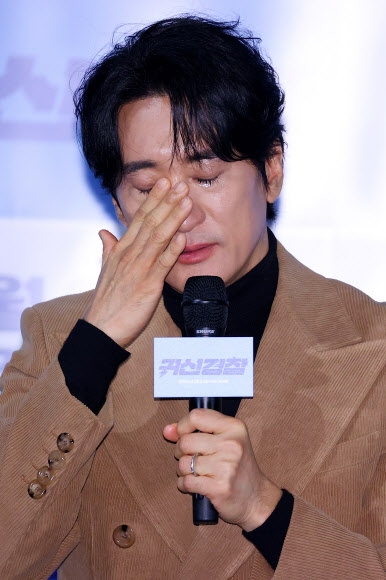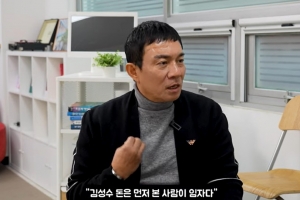лӢӨмқҙлӮҳлӘЁ мһ‘м „ мҙҲл°ҳ мқјмЈјмқјм—җ 집мӨ‘н•ҳлҠ” мқҙ мҳҒнҷ”к°Җ кІҪмқҙлЎӯкІҢ лӢӨк°ҖмҳӨлҠ” к№ҢлӢӯмқҖ, м–ҙм°Ң ліҙл©ҙ лӢЁмҲңн•ң мқҙм•јкё°лҘј л§ҲлІ•кіј к°ҷмқҖ мӢңк°„ м—°м¶ңмқ„ нҶөн•ҙ кІ°мҪ” лӢЁмҲңн•ҳм§Җ м•ҠмқҖ мқҙм•јкё°лЎң л§Ңл“Өм–ҙ лғҲлӢӨлҠ” лҚ° мһҲлӢӨ. м¶ңм„ёмһ‘ вҖҳл©”л©ҳнҶ вҖҷ(2000)м—җм„ң м„ңлЎң л°ҳлҢҖ л°©н–ҘмңјлЎң нқҗлҘҙлҠ” л‘җ к°Җм§Җ мӢңк°„мқ„ көҗм°ЁмӢңнӮӨл©° кҙҖк°қмқ„ нҷҖл ёлҚҳ лҶҖлҹ° к°җлҸ…мқҖ м„ё к°Җм§Җ мӢңм җ(жҷӮй»һ) лҳҗлҠ” мӢңм җ(иҰ–й»һ)мқ„ м ңмӢңн•ҳкі мҳҒнҷ”лҘј мӢңмһ‘н•ңлӢӨ.
лҚ©мјҖлҘҙнҒ¬ н•ҙм•Ҳм—җм„ң мӮҙкё° мң„н•ҙ лӘёл¶ҖлҰјм№ҳлҠ” м—°н•©кө°, мқҙл“Өмқ„ кө¬н•ҳкі мһҗ лӘ©мҲЁмқ„ кұёкі лҚ©мјҖлҘҙнҒ¬лЎң н–Ҙн•ҳлҠ” лҜјк°„ ліҙнҠё, к·ёлҰ¬кі н•ң мӢңк°„ 분лҹүмқҳ м—°лЈҢл§Ң лӮЁмқҖ мғҒнҷ©м—җм„ң лҚ©мјҖлҘҙнҒ¬мқҳ н•ҳлҠҳмқ„ ліҙнҳён•ҙм•ј н•ҳлҠ” мҳҒкөӯ м „нҲ¬кё° мҠӨн•ҸнҢҢмқҙм–ҙмқҳ нҢҢмқјлҹҝмқҙлӢӨ. н•ҙм•Ҳм—җм„ңмқҳ мқјмЈјмқј, л°”лӢӨ мң„ ліҙнҠём—җм„ңмқҳ н•ҳлЈЁ, н•ҳлҠҳ мң„ мҠӨн•ҸнҢҢмқҙм–ҙм—җм„ңмқҳ н•ң мӢңк°„мқҙ мҲңм°Ём ҒмңјлЎң көҗм°Ёлҗҳл©° мөңмҙҲ 3л§ҢлӘ…мқҙ нғҲм¶ңм—җ м„ұкіөн•ҳлҠ” мҲңк°„мқ„ н–Ҙн•ҙ м„ңлЎң лӢӨлҘё мҶҚлҸ„лЎң м№ҳлӢ«лҠ”лӢӨ. к·ё кіјм •м—җм„ң н•ҳлҠҳмқҳ мқҙм•јкё°к°Җ л°”лӢӨмқҳ мқҙм•јкё°мҷҖ лЁјм Җ кІ№міҗм§Җкі , лҳҗ мңЎм§Җмқҳ мқҙм•јкё°мҷҖ н•©міҗм§Җл©° мҳҒнҷ”лҠ” м Ҳм •мңјлЎң м№ҳлӢ«кі , мқҙнӣ„ лҳҗ к°Ғмһҗмқҳ мҶҚлҸ„лЎң нқҳлҹ¬к°ҖкІҢ н•ҳлҠ” м—°м¶ңмқҙ мҳҲмҲ к·ё мһҗмІҙлӢӨ. лҶҖлҹ° к°җлҸ…мқҳ мһ‘н’Ҳ мӨ‘ к°ҖмһҘ 짧мқҖ 106분мһ„м—җлҸ„ мҳҒнҷ”к°Җ м „нҳҖ 짧кІҢ лҠҗк»ҙм§Җм§Җ м•ҠлҠ” кІғмқҖ мқҙлҹ¬н•ң вҖҳмӢңк°„мқҳ м—°кёҲмҲ вҖҷ л•Ңл¬ё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
кҙҖк°қл“Өмқ„ 80л…„ м „ лҚ©мјҖлҘҙнҒ¬ н•ҙм•ҲмңјлЎң лҚ°л Өк°ҖлҠ” лҳҗ лӢӨлҘё мҡ”мҶҢлҠ” нҷ”л©ҙмқҙлӢӨ. вҖҳлӢӨнҒ¬ лӮҳмқҙнҠёвҖҷм—җм„ңл¶Җн„° мқёк°„мқҳ лҲҲмңјлЎң лӢҙмқ„ мҲҳ мһҲлҠ” мөңлҢҖм№ҳлҘј ліҙм—¬ мӨҖлӢӨлҠ” м•„мқҙл§ҘмҠӨ(IMAX) м№ҙл©”лқјлҘј нҷңмҡ©н•ҙ мҳЁ лҶҖлҹ° к°җлҸ…мқҖ м„ л°•мқҳ мӢӨлӮҙ мһҘл©ҙ м •лҸ„лҘј м ңмҷён•ҳкі л•…кіј н•ҳлҠҳмқҙ л§һлӢҝм•ҳкұ°лӮҳ н•ҳлҠҳкіј л°”лӢӨк°Җ л¬јлҰ¬лҠ” мһҘл©ҙмқҖ м•„мқҙл§ҘмҠӨлЎң м°Қм—ҲлӢӨ. мӢ¬м§Җм–ҙ мўҒмқҖ м „нҲ¬кё° мЎ°мў…м„қк№Ңм§Җ м•„мқҙл§ҘмҠӨ м№ҙл©”лқјлЎң лӢҙм•„ лғҲлӢӨ. лҹ¬лӢқнғҖмһ„мқҳ 70% мқҙмғҒмқ„ м°Ём§Җн•ңлӢӨ. лӮҳлЁём§Җ мһҘл©ҙл“ӨлҸ„ 65гҺң м№ҙл©”лқјлЎң мҙ¬мҳҒн•ҙ нҳ„мһҘк°җмқ„ к·№лҢҖнҷ”н–ҲлӢӨ. 12м„ё кҙҖлһҢк°Җ.
нҷҚм§ҖлҜј кё°мһҗ icarus@seoul.co.kr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