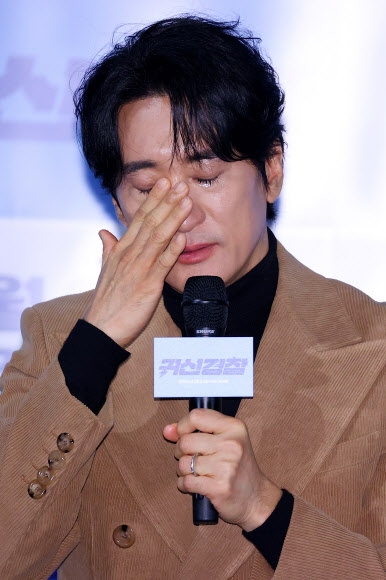파리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나 사진계의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무조건 특종을 좇기보다 사람들의 일상에 애착을 가졌던 두아노의 발자취가 무척이나 정겹게 다가온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풍경을 찍는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인생관을 담아 능동적으로 피사체를 찾아다니며 셔터를 누른다. 사진작가의 자질을 호기심과 반항심, 그리고 낚시꾼 같은 인내심이라고 말하는 두아오는 자신이 설정한 구도 안에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마치 저격수처럼 기다리고 기다린다. 컬러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주로 흑백 사진을 찍은 까닭에 대해 “사진집을 만들 때 싸기 때문”이라며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다큐를 보고 있으면 예술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띈다. 1980년대 병든 아내를 보살펴야 했던 두아노는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했다. 당시 그에게 작업을 의뢰했던 프랑스 여성지 ‘팜’의 편집장이 한 말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의뢰가 필요합니다. 의뢰는 고귀한 겁니다. 의뢰가 곧 고귀한 예술이죠.” 예술가로 살아가기 힘든 현재 한국 사회에 더욱 필요한 이야기로 다가온다. 24일 개봉. 전체 관람가.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