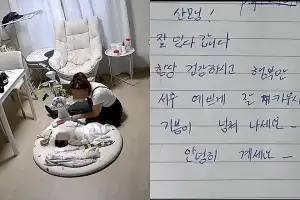이건 혹평이 아니다. 리춘신이라는, 중국 깡촌에 사는 한 소년, 그것도 평발에다 몸도 허약한 한 소년이 우연한 기회에 중국 공산당이 주관하는 발레 아카데미에 뽑혀가고,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최고의 발레리노에 등극하는 이야기다. 리춘신(50)은 실존 인물이다. 영화는 이제는 은퇴한 뒤 호주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의 책을 토대로 했다.
가장 즐길 만한 부분은 발레 장면. 발레에 뛰어난 배우가 아니라 아예 현직 발레리노를 배우로 뽑았다. 리춘신 역은 영국 버밍햄 왕립발레단의 중국인 수석 츠차오가 맡았고, 나머지 주요 배역들 역시 모두 현직 무용수로 채웠다. 물론 프로 배우들만은 못하다. 일부 장면에서는 신파 냄새도 난다. 하지만 화려한 발레 장면이 있으니 눈 감아 줄 만하다.
연기면에서는 리춘신을 조련하는 미국 휴스턴 발레단 예술감독 벤 역을 소화해 낸 브루스 그린우드가 인상적이다. 발레단 예술감독에 어울리는 섬세한 몸동작과 발성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다만 ‘리춘신의 중국’을 형상화하는 데 철저히 서구적 시선을 따른다는 점은 불편하다. 마오쩌둥의 얼굴이 곳곳에서 돌출하고, 만리장성이 늘어져 있고, 어린 리춘신은 장래 희망을 홍위병이라 말하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 모험주의 노선을 상징하는 장칭(마오쩌둥의 부인)이 등장한다. 중국의 발레는 온통 혁명과 총과 칼이 넘실대는 붉은색뿐이다.
교차편집을 통해 대조적으로 제시되는 미국은 전혀 다르다. 영화 초반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조지 거슈인의 경쾌한 피아노 소리다. 또 리춘신을 영입하는 곳은 텍사스주의 주도 휴스턴. 텍사스는 남부 보수주의의 본산이자 ‘부시(전 미국 대통령) 일가’와 연결되는 곳이다. 영화에 부시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리춘신이 처음 배우는 단어는 다름 아닌 팬태스틱(fantastic)이다. 서구인들이 리춘신을 소비하는 방식이 어째 우리 사회가 탈북자를 소비하는 방식과 비슷해 보인다.
때문에 발레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생한 감동적 휴먼 다큐라는 점 외엔 영화 자체의 미학은 찾아보기 어렵다. 줄거리 위주로 드라이하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출의 자제력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책 한권을 영상으로 옮기다 보니 숨이 너무 가빴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찍었던 호주 감독 브루스 베레스퍼드와 ‘샤인’의 극본을 쓴 잔 사디가 내놓은 2009년작. 117분. 28일 개봉.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