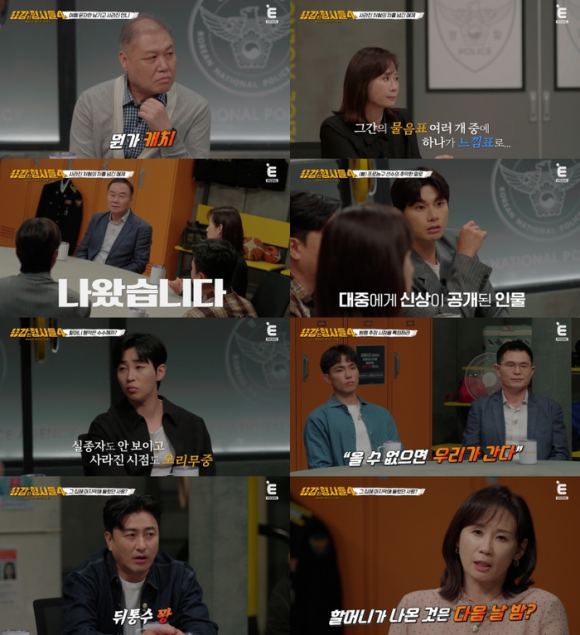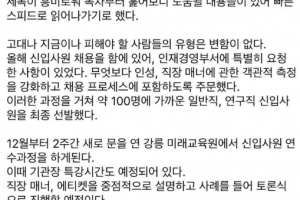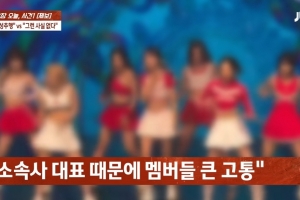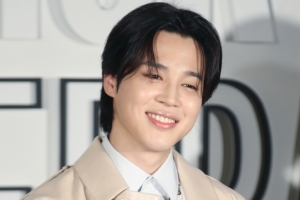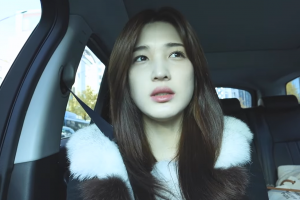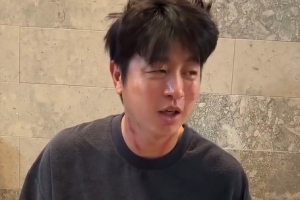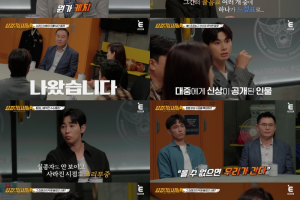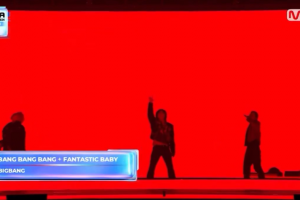중증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직업적 압박감과 피로감,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늘 운동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을 기피하고 대부분 풀 샷으로 인물들을 관찰하듯 담아내는데, 밤낮 없이 일하는 데이비드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그의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프랑코 감독은 데이비드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잡으며 그 감정에 몰입시키는 것과 간병하는 모습을 관조하며 그 피폐한 심리를 예측하게 만드는 것 중 후자를 택했는데, 이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영화를 건조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으로 완성시켰다.
후반부에 데이비드는 환자의 죽음을 도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선다. 이것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대두된 작금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대단히 특별하고 신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코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 흔한 윤리적 논쟁에서 한발 나아가 운명론과 결정론까지 감싸 안는다. 관객들은 까다로운 질문을 툭툭 던져 놓고 속 시원히 답을 내놓지 않는 영화의 태도가 짐짓 얄미우면서도 그 용의주도함과 정교한 낚시질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인물의 행동 묘사에 집중하는 초반부부터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차근차근 흘리며 은근히 감정을 고조시키는 내러티브 방식에서는 과연 2015년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다운 품위가 느껴진다. 여러모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미하엘 하네케의 ‘아무르’(2012)보다 분절적이면서 다층적이고, 동적이면서 고요한 작품이다. 오는 14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윤성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