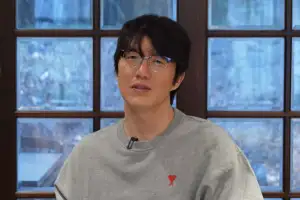하지만, 범죄현장의 목격자(주로 여자다)가 질병 혹은 장애 탓에 범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설정이 새로울 건 없다. 연쇄살인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여주인공(우마 서먼)이 살인마의 위협을 받는 ‘제니퍼 에이트’(1992)가 대표적이다. 여주인공이 자신을 보호하던 형사(앤디 가르시아)와 사랑에 빠진다는 점까지 ‘페이스블라인드’와 빼닮았다. ‘어두워질 때까지’(1967) ‘무언의 목격자’(1994)는 물론, 흥행과 평단의 고른 지지를 얻은 한국영화 ‘블라인드’(2011) 역시 비슷한 설정에서 출발했다.
결국, 스릴러 영화의 성패는 관객으로 하여금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후 던 잇’(who done it·누가 범인일까) 게임을 하도록 만드느냐에 달려 있을 터. 마그나 감독도 중반까지는 범인으로 의심받을 만한 ‘미끼’들을 하나둘 던진다. 하지만, 웬만큼 스릴러 영화를 본 관객에겐 너무 쉬운 가짜 미끼뿐이다. 막바지에 애나가 안면인식장애를 앓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 커레스트 형사(줄리언 맥마혼)와 닮은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대치하면서 관객과 애나 모두 헷갈리도록 한다. 그러나, 애나-커레스트 형사-용의자의 대치 구도를 너무 끌다 보니 긴장감보다는 피로함이 앞선다. 차라리 범인의 캐릭터에 공을 들이거나 살해동기에 살을 붙였어야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